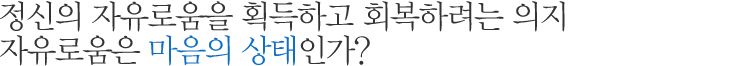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어떤 독자를 의식해서 쓰지는 않았다. 그것은 원제목이 말하듯이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글로서 그만큼 진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스토아 학파만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위에서 인용한 명상록의 앞부분에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압축되어 있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그의 조부와 부모로부터 배웠다고 밝힌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욕망을 절제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동서양과 고대, 현대를 막론하고 세계 종교와 철학자들이, 아니 일반인들 대부분이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항상 가치있게 받아들이는 보편적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아우렐리우스의 개인적인 의도는 전혀 아니었지만, 그의 시대에 탄압을 받았던 기독교가 스토아 학파를 자신과 융합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는 사람은 이 책의 저변에 깔린 아우렐리우스의 불안과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쟁터에서 막사에 돌아와 마음에서 자신의 휴식처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글을 쓰고 있는 황제 철학자를 상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 혹자는 이런 불안을 장기적 원정으로 지친 당시 로마사회의 분위기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이라고 보인다. 열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추구하여 얻으려는 상태가 ‘아파타이아’ 임은 앞에서 말했다. 한 마디로 정신의 자유로움을 획득 내지는 회복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로움이란 마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가 편하고 좋다면 인간은 반복적으로 그 상태를 추구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욕망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행복에 이른다는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다시 욕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